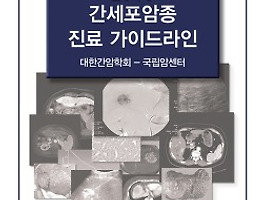1차 치료 실패 후의 2차 치료
간절제, 간이식, 고주파열치료술로 완치 후 간내 재발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2차 치료는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각각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전향적인 대조군연구는 전세계적으로 2차 전신치료제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간세포암종의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는 간세포암종의 특성상 매우 흔하기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처음으로 1차 치료 실패 후의 2차 치료에 대해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간절제 후 간내 재발 치료
간절제 후 간내 전이로 인한 국소재발 (dissemination) 또는 새 종양의 발생(de novo carcinogenesis)으로 인한 재발 빈도는 수술 후 5년에 약 50-70% 전후이다. 기존 종양의 간내 전이로 인한 종양의 재발은 보통 간내 다결절 재발 (intrahepatic multiple recurrence)로 나타나며 이런 경우 근치적 치료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새로운 종양 발생 (de novo recurrence)의 경우 근치적 재수술 또는 국소치료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술 후 2년 이내의 재발을 조기 재발(early recurrence), 2년 이후의 재발을 후기 재발(late recurrence)로 분류한다. 재발의 위험인자로는 종양관련 위험인자와 기저 간질환관련 위험인자로 대별할 수 있다. 종양관련 위험인자는 종양의 크기, 개수, 분화도, 혈관침범, 혈청 AFP 값(수술 전 상승된 경우), 충분한 절제연의 미확보, 비해부학적 절제술(non-anatomical resection) 등이 해당되고, 주로 조기 재발과 연관된다. 기저 간질환 관련 위험인자는 만성 B형간염의 경우 수술 전후 높은 혈청 HBV DNA 농도, 만성 C형간염의 경우 활동성 염증상태 지속 및 간섬유화 정도 등이 알려져 있고, 후기 재발과 관련성이 높다. 다수의 후향적 연구들에 따르면, 간내 재발에 대한 반복적인 간절제는 전체 5년 생존율이 52%(범위 22-83%)인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제간이식(salvage liver transplantation)은 반복 간절제에 비해 무병생존율 및 전체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지만 수술과 관계된 합병증 발생이 의미있게 더 높다. 그러나 반복 간절제를 시행할 대상자는 이전의 간절제 후 잔존 간이 적어서 간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는 제한적이며, 간이식은 기증자 문제 등으로 좀 더 제한적이다. 반복 간절제가 불가능한 재발 간세포암종에 대해서는 고주파열치료술 및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같은 비외과적 국소치료가 필요하다. 고주파열치료술은 작은 재발 간세포암종에 대한 최소 침습치료로서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 경동맥화학색전술은 특히 다발성 간내 재발에 대해 가장 널리 시행되는 치료법이다. 수술 후 발생한 간내 재발암의 치료는 앞서 기술한 각각의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한 메타분석에서 각 치료법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재발 당시의 환자의 잔여 간기능, 재발암의 위치,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고주파열치료술 후 간내 재발 치료
수술적 치료 대상이 되지 않아 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경피적 에탄올주입술 등의 국소치료를 시행한 경우 대체로 국소재발(local recurrence)이 수술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국소재발의 정의는 국소치료 후 치료부위 또는 변연에서 종양이 재발한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완치 후 재발된 경우만을 뜻한다. 치료 후 2년까지의 국소재발률은 고주파열치료술 2-18%, 경피적 에탄올주입술 11-45% 이다. 경피적 에탄올주입술은 병소 내에 주입한 에탄올의 확산이 종양 내 섬유성 격벽 또는 종양 피막 등에 의해 차단되어 치료 효과가 감소될 수 있고, 특히 장경 3 cm 이상의 큰 병변에서 국소재발률이 43%에 달하여 주의를 요한다.
국내 단일기관의 대규모 후향적 자료에 따르면 장경 5 cm 이하의 단일 종양 또는 3 cm 이하의 3개의 결절 이하 간세포암종의 고주파열치료술 치료 후 5년의 간내 누적 재발률은 73.1%, 10년의 누적 재발률은 88.5% 였다. 고주파열치료술은 간기능이 잘 보존된 작은 단일 종양, 특히 장경 2 cm 이하에서 가장 결과가 좋아서 75년 생존율 70%를 보인다. 고주파열치료술 이후에 간내 재발한 경우 고주파열치료술을 재시행하여 완전반응에 이른 경우 생존율의 향상을 보일 수 있어 국소재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또한 고주파열치료술 후 재발암에 대해 간 절제나 구제간이식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주파열치료술 재시행과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이며, 수술적치료나 고주파열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
간이식 후 간내 재발 치료
Milan 기준 이내의 상태로 간이식을 시행하더라도 간세포암종의 재발률은 8-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억제제 사용에 따른 영향으로, 간이식 후 재발한 간세포암종의 예후는 불량해서 재발 진단 후 중앙생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며, 5년 생존율은 22%에 불과하다. 간이식을 받은 119명의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17.2개월의 중앙추적기간 중 16명 (13.4%)에서 재발이 나타났고, 간내 재발이 가장 많았다. 간이식을 받은 857명의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식 후 중앙추적기간 15.8개월에 106명 (12.4%)에서 재발하였고 재발 후 중앙생존기간은 10.6개월이었다. 재발 부위는 폐 (55.7%), 이식 간 (37.8%), 복강 (37.7%), 뼈(25.5%)의 순서였다. 간이식 후 재발한 간세포암종 환자의 예후는 이식 전 병기나 적출한 간의 병리 소견 뿐 아니라 이식 후 재발까지의 시간, 여러 장기의 침범 여부 등이 관여하고 재발 암에 대한 치료방법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이식 후 간세포암종이 재발하더라도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생존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세포암종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재발한 121명의 환자에서 38명(31.4%)이 간절제나 국소치료를 받았고 51명(42.1%)은 완화적 치료를, 나머지 32명(26.4%)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근치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의 중앙생존기간이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월등히 길었다.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간세포암종으로 생체간 이식을 받은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재발한 17명의 치료 성적을 분석하였다. 9명의 환자에게는 간 절제(6건), 폐 전이 절제(10건), 림프절 전이 절제(3건)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8명의 환자에게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적 절제를 받은 환자들의 1, 3, 5년 생존률은 각각 100%, 87.5%, 87.5%인 반면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생존률은 각각 50%, 12.5%, 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이식 후 재발한 간세포암종이 간내에 국한되어 있고,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때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간이식을 받은 486명의 환자 중 78명(16%)에서 간세포암종이 재발하여 15명은 간절제를, 11명은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2명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수술군의 1, 3, 5년 생존률은 각각 92%, 51%, 35%였고 고주파열치료군의 생존률은 87%, 51%, 28%로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879). 수술군의 1, 3, 5년 무재발 생존률은 83%, 16%, 16%였고 고주파열치료군의 무재발 생존률은 각각 76%, 22%, 0%로 역시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745). 간이식 후 재발하는 간세포암종은 다발성이거나 간외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치적인 간절제나 고주파열치료술을 적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간이식 후 재발했을 때 경동맥화학색전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간내 또는 간내와 간외 재발한 간세포암종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부분반응(partial response)은 57%에서, 불변(stable disease)은 28%에서 나타났고 14%의 환자에서는 질환이 진행하였다. 경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재발 이후 6, 12, 24개월 생존률은 각각 64.3%, 50%, 22.2%인 반면 전신 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 14명의 생존률은 35.7%, 21.4%, 10.7%였다(P=0.034). 경동맥화학색전술 후 Child-Pugh 점수가 상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각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색전후증후군의 정도 역시 간이식을 받지 않는 환자들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대만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간이식 후 간세포암종이 다발성으로 재발한 11명의 환자가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고 중앙생존기간은 6.6개월(0.3-12.7개월), 1년 생존률은 12.5%였다.
간이식 후 광범위한 재발로 인해 간절제나 고주파열치료술,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도하지 못할 때 또는 국소치료 후에도 진행하는 경우에 소라페닙을 사용할 수 있으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잘 고안된 무작위 대조군연구는 없다. 39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연구(case-control study)에서 24명은 최선의 지지요법을 받았고 15명은 소라페닙으로 치료받았는데, 재발 시점으로부터 중앙생존기간이 소라페닙군에서 21.3개월로 지지요법군의 11.8개월보다 유의하게 길었고(HR 5.2, P=0.0009), 소라페닙 투여에 따른 심각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간이식 후 소라페닙의 독성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라페닙과 mTOR 억제제인 everolimus를 병합 투여했을 때 위장관 출혈로 인한 사망 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이식 후 간세포암종이 재발한 34명의 환자에서, 17명은 소라페닙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7명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두 군의 3, 12개월 생존률은 각각 100%, 62%와 73%, 23%로 소라페닙 치료군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 반응은 설사(18%), 트랜스아미나제 상승(11%), 피로(11%), 수족피부반응(6%), 오심(6%)의 순서로 나타났다.
[권고사항]
1. 간절제, 고주파열치료술, 또는 간이식으로 완치된 후 재발한 간세포암종은 재발 시기와 환자의 잔여 간기능과 전신상태, 재발암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재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C1).
간세포암종의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
통상적 TACE (cTACE)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서 생존율 향상이 입증되어, BCLC 중간 병기 또는 간절제, 간이식, 국소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우면서 수행상태가 양호하고 주혈관침범이나 간외전이가 없는 간세포암종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cTACE는 고식적(palliative) 치료의 특성이 강하여 대부분 반복치료가 필요하나, 반복에도 불구하고 질병 진행이 흔하여 TACE 불응성(refractoriness) 또는 실패(failure)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TACE 불응성은 종양 특성상 TACE 치료반응이 낮은 경우이고 TACE 실패는 기술적 문제 또는 잘못된 적응증을 지칭한다. 최근 TACE 불응성을 정의하기 위한 몇몇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내 단일 기관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cTACE 중 병기진행(stage progression, 이하 SP)을 cTACE 불응성의 대리지표(surrogate endpoint)로 설정하고 첫 cTACE 후 6개월 동안 도합 3회의 cTACE가 필요하였거나 질병 진행이 발생한 경우 무병기진행 생존(SP free survival)이 불량해짐을 보여 이를 cTACE 불응성에 대한 예측인자로 제시하였다. 이는 cTACE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불응성을 판단하여 신속한 치료 변경을 가능하게 하나, cTACE 후 간기능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고, 널리 검증되지 않은 등의 한계가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제안된 ART (Assessment for Retreatment with TACE) score는 cTACE 후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상승, Child-Pugh 점수의 상승, 영상의학적 종양반응의 부재 등을 조합한 점수 체계로, score가 2.5 이상인 경우 불량한 생존율과 두 번째 cTACE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므로 sorafenib 등으로의 조기 전환을 권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첫 cTACE 전 BCLC 병기, AFP, cTACE 후 Child-Pugh 점수 변화, 영상의학적 치료반응 등을 조합한 ‘ABCR’ 점수체계를 개발하여 ART score보다 예후예측능이 우월함을 보고하였고, ABCR≥4인 경우는 추가적인 cTACE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2년 유럽 가이드라인은 최소 2회의 cTACE에 무반응이면 ‘treatment stage migration’라 하여 sorafenib으로의 변경을 권고하였고, 2014년 대한간암학회 진료가이드라인에서는 반복적인 TACE 후 병기의 상향이동을 TACE 실패로 간주하여 sorafenib을 권고하였다. 2014년 일본 간학회에서는 TACE 후 1-3개월 째 반응평가에서 i) 50% 이상의 병변에서 불충분한 치료반응이 2회 이상, ii) 직전 TACE시행 전에 비해 종양 개수의 증가가 2회 이상, iii) 새로운 혈관침범 또는 간외전이, iv) 종양표지자의 무반응 등을 TACE 실패로 정의하였다. TACE 불응성은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될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sorafenib이 TACE 불응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소라페닙 등 전신치료제는 TACE 불응성이 간외전이 등 병기의 상향 이동으로 발현한 경우는 우선 고려해야 하겠으나 간내 재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TACE 불응성에서의 효과근거는 부족하다. 간접적인 근거로 sorafenib 3상 임상시험의 사후분석에서 과거 TACE 후 진행한 환자군에서 sorafenib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예후의 향상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국소치료법들과의 비교가 없어 소라페닙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기 어렵다. 최근 일본의 후향적 연구에서 상기 TACE 불응성 진단기준에 근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sorafenib으로 변경한 군과 TACE를 지속한 군을 비교하여 sorafenib군이 전체생존 및 종양진행까지의 시간 모두 우월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TACE 불응성으로 판정된 환자들을 포함한 일본의 소규모 후향적 연구에서 간동맥주입화학요법(hepatic arterial infusion chemotherapy, HAIC)이 종양반응 및 생존율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앞으로 최근 개발된 여러 전신치료제들의 TACE 불응성에 대한 치료적 역할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cTACE가 조직 저산소증에 따른 허혈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항혈관생성물질로서의 역할을 갖는 sorafenib 등의 약제를 병용하여 치료 결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다양한 병기의 환자군을 포함하는데, TACE 불응성만을 대상으로 디자인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병행치료 연구들 중, 한 메타분석에서는 병행치료가 종양진행까지의 시간은 연장시켰으나 전체생존율의 향상은 분명하지 않았고, 약물방출미세구를 이용한 TACE (DEB-TACE)와 sorafenib 병행치료(SPACE 연구)는 종양진행까지 시간 연장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최근 유럽에서 절제불가능한 간내 국한된 간암에서 DEB-TACE와 sorafenib의 병행치료에 관한 다기관 3상 연구(TACE 2)가 보고되었는데 양 군간 무진행생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시아에서 수행된 절제불가능한 간내 국한된 간암에서 cTACE와 orantinib (TSU-68)의 병행치료에 관한 다기관 3상 연구(ORIENTAL 연구) 역시 일차 목표인 전체생존기간 향상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TACE 불응성에 대한 대안으로 TACE와 표적치료제의 병행치료를 권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권고사항]
1.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암종에서 6개월 이내 2회 이상의 대응형(on-demand) 통상적 TACE를 시행하였으나 객관적 치료반응(완전반응 또는 부분반응)의 부재, 새로운 혈관침범, 또는 간외 전이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TACE 불응성으로 판단하고 치료방법의 변경을 고려한다(C1).
소라페닙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
소라페닙(sorafenib) 치료 중 기존 병변의 진행, 또는 새로운 간내 또는 간외 병변이 나타나면 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양한 진행 양상은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612 실제 임상에서 소라페닙의 중앙 투약기간은 12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종양의 진행이나 약물 부작용, 간기능 악화 등의 여러 요인들이 소라페닙의 장기 투여를 어렵게 한다.
소라페닙 투여에도 종양이 진행하거나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2차 전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fibroblast growth factor (FGF)와 VEGF 억제제인 brivanib, mTOR 억제제 everolimus, VEGF-2를 차단하는 단클론항체 라무시루맙(ramucirumab), 비선택적 c-Met 억제제 Tivantinib 등이 3상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모두가 위약군에 비해 생존율 증가를 입증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1) 레고라페닙
레고라페닙(regorafenib)은 혈관신생, 종양발생, 전이, 종양면역 등에 관련된 신호를 차단하는 multikinase inhibitor인 경구용 분자표적치료제로, 소라페닙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졌으나 소라페닙과 분자표적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였지만, 간기능이 Child-Pugh A로 보존되고 ECOG 수행능력 0-1인 환자들에서 레고라페닙의 2차 치료제로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적 3상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대상 환자들은 소라페닙 치료의 마지막 28일 중 최소 20일 이상 매일 400 mg 이상 소라페닙을 복용하였고, 이상 반응으로 소라페닙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종양이 진행
된 경우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는데 2:1의 비율로 레고라페닙군과 위약 대조군에 배정되었다. 레고라페닙을 복용한 환자들의 중앙생존기간은 10.6개월(95% CI 9.1-12.1)로 대조군의 7.8개월(95% CI 6.3-8.8)보다 유의하게 길어(HR 0.63, 95% CI 0.50-0.79, P<0.001) 2차 전신치료제로서 처음으로 생존 증가 입증에 성공하였다. 레고라페닙군의 중앙 무진행생존(PFS)은 3.1 개월(95% CI 2.8-4.2)로 대조군의 1.5개월(95% CI 1.4-1.6)보다 유의하게 길었고(P<0.001), mRECIST로 평가한 중앙 종양진행까지의 시간(TTP) 역시 각 군에서 3.2개월(95% CI 2.9-4.2), 1.5개월(95% CI 1.4-1.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레고라페닙과 관련된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고혈압(15%), 수족피부반응(13%), 피로감(9%), 설사(3%)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레고라페닙의 평균 사용기간은 5.9개월(표준편차 6.0), 위약 3.3개월(표준편차 3.9)이었다.
(2) 니볼루맙
니볼루맙(nivolumab)은 면역관문억제제로서 환자 T세포 표면의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1 (PD-1) 수용체에 결합하여 억제된 암세포 살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정맥주사용 재조합 사람 IgG4 단클론항체 PD-1 억제제이다. 최근 발표된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의 니볼루맙 1/2상의 무대조 다국적 임상시험(CheckMate 040) 대상은 조직학적으로 확진되고, Child-Pugh 점수 6점 이하(dose-escalation 7점 이하)이며 전신수행능력 ECOG 0-1인 간세포암종 환자로서 B형간염이 원인인 경우 혈청 HBV DNA는 100 IU/mL 미만이었다.622 본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을 보면, 145명의 이전 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소라페닙 실패 132명, 부작용으로 중단 12명)에서 2주 간격으로 3 mg/kg의 용량으로 니볼루맙이 정맥투여되었고, 일차 목표는 객관적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이차 목표는 전체생존율과 질환조절률(disease control rate) 등이었다. 객관적 반응률은 20%(95% CI 15-26)였고, 중앙 반응 지속기간 9.9개월, 12개월 생존율 60%(95% CI 51.4-67.5)였으며, 3/4 등급의 이상 반응
으로 피로감, 소양감, 발진, 설사 등이 2% 이하에서 나타났다. 미국 식약청은 CheckMate 040 무작위 1/2상 결과만으로 소라페닙 치료 후 2차 치료제로서 니볼루맵 사용을 조건부 신속 승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2차 치료제로서의 최종 승인은 1차 치료제로서 니볼루맙 효과를 검증하는 3상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연구 CheckMate 459 (ClinicalTrials.gov NCT025276509) 결과가 나오면 진행될 예정이다.
(3) 카보잔티닙
카보잔티닙(cabozantinib)은 MET, VEGFR2, RET 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경구용 분자표적치료제로서 진행성 간세포암종으로 소라페닙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 중 간기능 Child-Pugh A와 ECOG 수행능력 0-1을 유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 또는 3차 치료제로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다국적 3상무작위 대조연구가 시행되었다. 대상 환자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 소라페닙 포함 두가지 이하의 전신치료를 받았으나 질환 진행을 보인 환자들이었다. 연구의 일차 목표는 전체생존(OS) 평가이었고 이차 목표는 무진행 생존(PFS)과 RECIST 1.1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ORR)이었다. 전체 대상 환자들 중 27%는 소라페닙 포함 2가지 전신치료를 받았었는데, 카보잔티닙 치료군의 중앙 전체생존은 10.2개월로 위약 대조군의 8.0개월보다 유의하게 길어(HR 0.76, 95% CI 0.63-0.92, P=0.0049) 임상시험은 성공하였다. 하위그룹 분석에서 소라페닙만 치료했었던 환자에서 카보잔티닙 중앙 전체생존은 11.3개월로 위약군 7.2개월에 비해 유의한 생존기간 증가를 보였다(stratified HR 0.70; 95% CI 0.55-0.88) 중앙 무진행생존 역시 카보잔티닙군에서 5.2개월로 대조군의 1.9개월보다 유의하게 길었고(HR 0.44, 95% CI 0.36- 0.52, P<0.001), 객관적 반응률 역시 카보잔티닙군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4% vs. 0.4%, P=0.0086). 카보잔티닙 투약기간 중앙값은 3.8개월이었으며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수족피부반응 (17%), 고혈압 (16%), 트랜스아미나제 상승 (12%), 피로감 (10%), 설사 (10%) 등이었다.
(4) 라무시루맙
라무시루맙(ramucirumab)은 VEGFR-2를 표적으로 하는 정맥주사용 단클론항체이다. 진행성 간세포암종의 소라페닙 치료 이후 2차 치료제로서 시행한 다기관 3상 무작위 대조군연구(REACH, NCT01140347)에서 위약군에 비해 전체생존 증가를 얻지 못해 임상연구는 실패하였었다. 그러나 혈청 AFP 400 ng/ml 이상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post-hoc 하위그룹 분석에서 위약군 4.2개월에 비해 라무시루맙군은 7.8개월의 의미있는 생존기간 증가를 보여(HR 0.67; 95% CI 0.51-0.90) 혈청 AFP이 높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다기관 3상 2 대 1 무작위 대조군연구(REACH-2, NCT02435433)를 다시 수행하였다. REACH-2 연구의 대상은 소라페닙 치료에도 진행(PD)을 보였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진행성 간세포암종(병리 또는 영상 진단) 환자들 중 Child-Pugh A, ECOG 0-1이며 혈청 AFP ≥400 ng/ml인 환자들이며 연구의 일차 목표는 전체생존 평가이었다. 2주 간격으로 라무시루맙 8 mg/kg 정맥주입을 받은 군의 중앙 전체생존은 8.5개월로 위약 대조군의 7.3개월보다 1.2개월 길어(HR 0.71, 95% CI 0.531-0.949, P=0.0199) 1차 목표를 달성하였다. 중앙 무진행생존 역시 라무시루맙군에서 2.8개월로 대조군 1.6개월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고(HR 0.452, 95% CI 0.339-0.603, P<0.0001), 질환조절률 (DCR)도 59.9% 대 38.9%로 의미있는 차이(P=0.0006)를 보였으나 객관적 반응률(ORR)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라무시루맙 투약기간 중앙값은 12주이었으며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고혈압 (12.2%)이 가장 흔했으며 저나트륨혈증(5.6%) 등이 보고되었다.
세포독성화학요법 및 간동맥주입화학요법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과 같은 1차 또는 2차 전신치료에 실패하거나, 이들을 사용할 수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잔존 간기능이 좋은 경우 세포독성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된 약제는 doxorubicin이나, 반응률은 대개 20% 미만이였다. 5-fluorouracil, gemcitabine, oxaliplatin, capecitabine, irinotecan, octreotide, interferon, tamoxifen 등의 전신 요법도 생존율 향상을 증명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단일 약제로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복합화학요법이 많이 시도 된다. Oxaliplatin을 포함하는 FOLFOX (oxaliplatin/fluorouracil/leucovorin) 복합화학요법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FOLFOX
복합화학요법과 doxorubicin 단독 요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공개 다기관 무작위 대조연구가(EACH study) 371명의 아시아 환자(중국(70%), 한국(14%), 태국(11%), 대만(5%)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일차 평가지표인 중앙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키지는 못하였지만 (6.4개월 vs. 4.9개월; P=0.07), doxorubicin 단독 요법에 비하여 무진행 생존기간(2.93개월 vs. 1.77개월, p<0.01)과, 불변(stable disease) 비율이 더 높았다(52.17% vs. 31.55%, p<0.001).641 EACH study에서 중국 환자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 FOLFOX 복합화학요법은 doxorubicin 단독 요법에 비하여 의미있게 생존기간이 길었다(5.9 개월 vs. 4.3개월, P=0.03).
진행성 간세포암종 204명을 대상으로 oxaliplatin과 gemcitabine을 병용하는 GEMOX (oxaliplatin and gemcitabine) 복합화학요법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은 4.5개월, 전체생존기간은 11.0개월이였다. 또한 소라페닙과 같은 표적치료에 실패한 40명의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2차 항암치료로써 GEMOX 복합항암요법의 후향적 연구에서 부분 반응 20%, 불변 46% 였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3.1개월, 중앙생존기간은 8.3개월이였다.
Oxaliplatin이 포함된 총 17개의 임상 연구, 800명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 부분반응 16%,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 4.2개월, 중앙 전체생존기간은 9.3개월이였다. Liu 등은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결과를 포함하여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oxaliplatin이 포함된 복합화학요법의 임상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보고하였는데, 부분반응 14%,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 4.7 개월, 중앙 전체생존기간은 9.5개월이였다.
간세포암종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고, 이는 항암제의 흡수와 대사 등에 영향을 미쳐 충분한 용량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항암제에 의한 독성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간세포암종에서 세포독성화학요법은 전신상태와 간기능이 양호한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무의미하게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하거나 독성이 강한 약제는 용량 감량을 고려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세포독성화학요법의 다른 형태인 간동맥주입화학요법(hepatic arterial infusion chemotherapy, HAIC)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간동맥에 직접 주입하여 간세포암종에 고농도의 항암제를 전달하면서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5-fluorouracil 로, 단독 혹은 cisplatin 등과 병합으로 쓰인다. 선행 연구에서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전반적인 반응률은 3.8~38.5%, 부분반응은 7~81%, 중앙 전체생존기간은 5~19.5개월이였다. 일본에서 28년간 14,246예의 HAIC의 치료 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5년 생존율은 32%, 중앙생존기간은 약 31개월로 조사되었으며, 통상적 경동맥화학색전술(cTACE)의 성적과 비슷하였다. HAIC의 치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는 잔존 간기능이며, 치료 4주 후에 평가한 Child-Pugh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았다. 소라페닙과 HAIC의 효능을 직접 비교한 전향적 연구는 없으나 후향적 연구에서 HAIC은 소라페닙에 비해 생존기간과 종양반응률이 더 우수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양군간에 생존기간은 차이가 없었
다는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다만 간문맥침범이 있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만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 HAIC이 소라페닙에 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658 주간문맥을 침범한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HAIC과 TACE를 비교한 국내 다기관 후향적 연구에서 HAIC은 TACE에 비하여 종양반응 및 생존율이 높았다. 적은 규모의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2상 무작위 대조연구에서 소라페닙과 HAIC 병행치료는 소라페닙 단독 치료군보다 생존율이 높았으나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무작위 전향적 대조연구에서 소라페닙과 HAIC 병행치료는 소라페닙 단독치료군과 비교하여 생존율에 차이가 없어 1차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권고사항]
1. 최소 3주 이상 400mg 이상의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서 간기능이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이면, 레고라페닙을 투여한다 (A1).
2.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소라페닙 부작용으로 중단한 환자에서 간기능이 Child-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이면 니볼루맙을 투여할 수 있다 (B2).
3. 소라페닙 포함 2가지 이하의 전신치료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암종이 진행한 환자에서 간기능이 Child-Pugh A 이고 전신상태 ECOG 0-1 이면 카보잔티닙을 투여한다 (B1).
4. 소라페닙 치료에도 간세포암종이 진행하거나 소라페닙 부작용으로 중단한, 간기능이 Child- Pugh A이고 전신상태 ECOG 0-1이며 혈청 알파태아단백 400 ng/ml 이상인 환자에서 라무시루맙을 투여할 수 있다 (B2).
5.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과 같은 1차 및 2차 전신치료에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양호한 간기능과 좋은 전신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 세포독성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C1).
6. 소라페닙, 렌바티닙,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과 같은 1차 및 2차 전신 치료에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가 간문맥침범을 동반한 경우 잔존 간기능이 좋고 종양이 간내 국한된 경우 간동맥주입화학요법(HAIC)을 고려할 수도 있다 (C2).
'소화기내과(간) > 간세포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암성 통증의 약물치료] (0) | 2018.09.15 |
|---|---|
|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치료] (0) | 2018.09.15 |
|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보조요법] (0) | 2018.09.07 |
|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전신치료] (0) | 2018.09.02 |
| 2018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체외 방사선치료] (0) | 2018.08.30 |